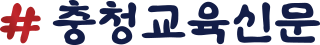어머니는 맏딸, 그러니까 전처가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에게 시집을 와서 낳은 딸이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의붓어머니인 셈이다.
그러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사이는 매우 돈독해 보였으며, 외할머니는 내게도 아주 잘 해주셨다.
나는 외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처음 외갓집을 갔을 때 이미 그 분은 돌아가시고 없었다.
외할아버지를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 분은 꽤 부자인데다가 공부도 많이 하고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신사였다고 한다.
본인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보고 와서는 가족 중에 둘째 아들과 작은 사위를 일본으로 유학을 시키셨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작은 외삼촌과 하나밖에 없는 이모의 이모부가 그 분들이다.
작은 외삼촌도 나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
원철이형의 아버지가 큰 외삼촌으로 이름이 손권섭이었고, 작은 외삼촌은 이름이 손양섭이었다.
양섭이 삼촌은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참전하였다.
그것이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아마 강제적인 타의에 의해서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나중에 일본군에서 탈영해서 그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다고 하니까 말이다.
남양군도, 그러니까 지금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어느 이름 모를 섬.
그곳 정글에서 몇몇 탈영병 동료들과 함께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외할아버지에게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바람결에 실려 온 소식이 작은 외삼촌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을 맞았는데도 작은 외삼촌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런 소식을 전해 오지도 않았다.
외할아버지는 사랑하는 막내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셨다.
그것도 집에서가 아니라 삼십 리 거리인 대전역에 매일 나가서 기차에서 사람들이 내릴 때마다 혹시 아들 양섭이가 오는 가 일일이 사람들을 살펴보고, 혹시 일본에서 귀국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붙잡아 놓고 손양섭이를 아느냐, 그에 대한 소문이라도 들어보았느냐고 묻곤 했다고 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일년 365일을......
그러다 외할아버지는 그리움에 지쳐서 그만 운명을 달리하시고 말았다고 한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교회에 더욱 열심히셨고......
내가 처음 외할머니를 본 것은 내 나이 다섯 살 때쯤인 것으로 기억이 된다.
희미한 내 어릴 적 기억의 맨 끄트머리, 거기에 외할머니와 외갓집 그리고 그 동네 입구에 서 있던 둥구나무(우리는 당시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래된 느티나무였던 것 같다)가 있다.
그 둥구나무 아래서 어린 꼬마였던 나는 외할머니를 처음 뵈었고, 그 분은 내 머리를 한참 동안 쓰다듬어 주셨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부여의 시댁,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네는 식구가 많고 농토는 별것이 없어서 열여섯 살 새댁이었던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아버지 몫인 땅 몇 마지기를 팔아 고향을 떠나기로 어렵사리 작정을 하였다.
소도 등을 비빌 언덕을 보고 간다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새금을 나 이사를 한 곳이 바로 대전에 있는 어머니의 친정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다섯 살 때쯤의 어느 봄날 어머니는 모처럼 깨끗한 외출복을 입으시고 내 손을 잡고 외갓집엘 가셨다. 많은 아이들 중에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내 한 손은 어머니가, 그리고 또 한 손은 외갓집에서 보낸 그 집의 머슴이 잡고 있었다. (다음호에 게속)
와 어머니는아버지 몫인 땅 몇 마지기를 팔아 고향을 떠나기로 어렵사리 작정을 하였다. 소도 등을 비빌 언덕을 보고 간다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새금을 나 이사를 한 곳이 바로 대전에 있는 어머니의 친정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다섯 살 때쯤의 어느 봄날 어머니는 모처럼 깨끗한 외출복을 입으시고 내 손을 잡고 외갓집엘 가셨다. 많은 아이들 중에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내 한 손은 어머니가, 그리고 또 한 손은 외갓집에서 보낸 그 집의 머슴이 잡고 있었다.